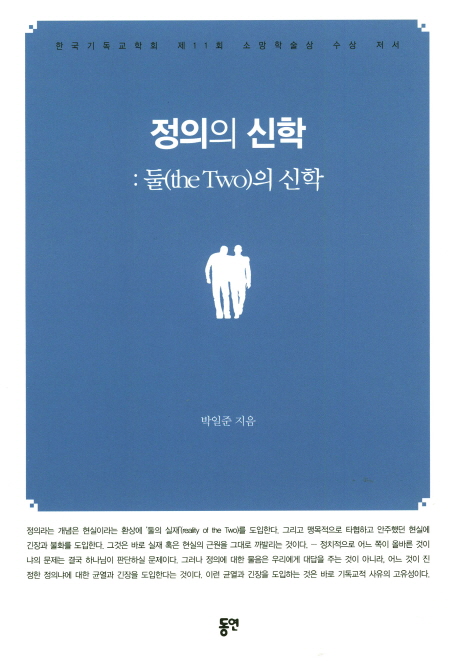
기자 시절, 굉장히 많은 주목을 했던/ 지금도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박일준 교수님의 첫 단독 저작입니다. 몰입감 넘치는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박일준 교수님의 첫 단독 저작은 <정의의 신학:둘의 신학>입니다. '둘'이라는 용어가 돋보입니다. 또한, 이는 박일준 교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사이between'이라는 용어와도 맞닿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세계로 나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박일준 교수님의 저작을 발췌해보았습니다.
정의는 "사이"의 문제이다. 정의는 현실이 아니다. 어쩌면 현실 세계 속에 실현되어본 적 이 없는 환상의 실재이다. 환상의 실재로서 정의는 현실화된 적이 없지만,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실존하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실재로 기능한다. 즉 이 비/현실적인 정의에 대한 환상이 우리 삶의 구조에 균열을 낸다. 이 삶은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고. 즉 사이는 해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환상의 공간이다.
박일준 <정의의 신학>,동연출판사, 완전 역대급인 서문 중에서....
우리는 늘 정의를 갈망합니다. 20~40대 남성분들은 어렸을 때, 정의의 사도가 등장하는 로보트가 나올 겁니다. 괴물로 형상화된 것들을 쳐부수는 기계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로봇이 등장해 괴물을 정의의 이름으로 파괴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정의는 이뤄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정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쉽게 부르짖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실체와 마주하기 때문에 결국 정의만 부르짖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일준 교수님은 정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삶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 봅니다. 정의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현실은 '가상'으로 바뀝니다. 이상을 꿈꾸면서, 이상이 도래하지 않은, 정의가 미처 도래하지 못한 현실이 되니까요. 정의를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가상의 세계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는 이러한 현실에 침투하기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입니다. 현실을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환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현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정의와 환상은 동일하지 않다. 정의는 우리 삶에 균열을 만들고, 우리 삶의 부정의함을 고발하면서, 삶을 붕괴시키며 난입하지만, 환상은 오히려 우리 삶의 균열을 그 환상을 통해 메워준다.
박일준 <정의의 신학>,동연출판사, 완전 역대급인 서문 중에서....2
그렇다고 상상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은 결국 환상으로 빠집니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편을 선택하고, 현재를 더욱 고착화시킵니다. '환상'으로요. 정의는 결코 환상일 수 없습니다. 정의는 환상을 배격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환상일까요?
믿음은 죽은 자에 대한 믿음이다. 그가 부활했다는.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확인할 길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전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의 생각을 믿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실현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박일준 <정의의 신학> 1장 발췌, 이것도 역대급1
그리스도교는 죽은 자,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인할 길 없읍니다. 저는 1900년대에 태어났으니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그를 전한 사람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를 전한 이들은 '정의'를 구현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를 읽습니다. 실존한다고 증명할 수 없지만, 그를 증명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테두리인 것이죠.
정의는 우리에게 둘의 출현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대항하는 관념의 도래로 인해 현실을 둘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분열을 겼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도 두뇌의 세계 인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재구성이다. 현실에 실현되어본 적 없는 이상도 우리의 개념적 생성물이다. 현실에 실현되어본 적 없는 이상도 우리의 개념적 생성물이다. 말하자면, 현실이라는 것도 이상이라는 것도 뇌의 관점에서 보면 재구성이고 가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둘'은 우리의 환상이다. 현실은 인상을 꿈꾸는 것과 같고, 이상은 가상적 현실의 창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상에 대한 환상 모두 이야기적 구조를 갖는다. 달리 말하자면, 정의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박일준 <정의의 신학> 1장 발췌2, 이것도 역대급2
예수라는 이상에 현실에 접목됩니다. 그의 도래로 현실은 둘이 됩니다. 기존 그리스도교가 '저 세계'로 도피하는 것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저 세계의 역할에 대해 '퉁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지, 가상의 세계 문제에 있어서 이토록 현실과 맞닿게 노력한 해석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박일준 교수님의 접근이 굉장히 맘에 듭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가상의 이상이 현실로, 현실이 가상화되는 그런 위태한 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지를 묻습니다.
'일리一理-읽기 > 책 그리고 패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소설 (2) | 2021.10.05 |
|---|---|
| 독자 (2) | 2021.10.01 |
| 쓰는 업에 대해 - 언론 매체를 스케치해보다 (2) | 2021.09.30 |
| 독서방법론 -개념을 따라가며 읽기 - 자크 랑시에르의 <감성의 분할> (1) | 2021.05.30 |
| 독서 모임론論 - 김영민 선생님 <사랑, 그 환상의 물매> (0) | 2021.05.29 |




